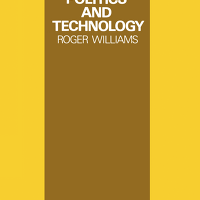이건 사실 내가 다녔던 국중고딩 시절 교육 정책의 실패로 읽히는데, 음악과 미술의 고전은 서양의 것과 등가 관계였다. 한국 혹은 동양의 음악과 미술은 한구퉁이에 찌그마하게 부록처럼 달려 있는게 고작이었다. 지금이야 오리엔탈리즘이네 뭐네 할 수 있지만 그 나이 때 뭘 알아겠나, 그저 그러니 그런가보다 했고 서양의 것들이 사실 뭐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러나 문제는 이게 한국이나 동양 그리고 서양의 것들은 막론하고 뭔가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저 교과서에 나오니 보고 공부하는 수준이었지 미술 작품들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는 게 쉬운게 아니었다. 음악은 그나마 라디오가 있어서 뭐라도 들을 수 있었지만 미술 작품들은 정말 교과서가 다였다.
거기에 가난한 도시 달동네 출신에 몸띵이가 이러니 미술작품 보러다니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다. 솔직히 부산이라는 동네가 미술작품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거의 전무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또 거기에다 먹고 살기 바쁜 아부지 엄니께서 손잡고 그런델 찾아가는 일도 없었고.
사정이 이랬으니 살아오면서 내가 이건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겠다 싶었던게 바로 미술작품 감상이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고 있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다. 그렇다고 핵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술기법을 잘 알아서 그런 걸 뽀인트로 알아챌 능력도 없었고 말이다.
스울 와서 가장 문화적 충격은 미술작품 감상할 것이 천지삐까리였다는 점이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뭔가 세련되게 음악과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앉아 있었다. 쓰벌, ㅋㅋㅋ
어쨌든 내 못난 탓, 자라온 환경 탓 등등 해서 아직도 내 열등감 비스무리한 건 미술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하등 상관없는 미학 관련 책들을 그렇게 읽었다. 이걸 읽어서 뭐하나 이러면서도 그리고 이해도 안 되면서 꾸역꾸역 읽었지만 뭘 아나, 늬믜. ㅋㅋㅋ
하지만 늘 마음의 부채처럼 남아 있는 미술에 대한 무제약적 앎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바닥부터 적어도 상식 수준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책들을 읽기도 한다.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했다.
하야간 요즘 재미붙이고 읽는 책이다. 겨우 1권 읽고 2권째 들어간다. 그런데 모르겠다, 뎅장. ㅋㅋㅋㅋㅋ
'그늘에 앉은 책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술관료제 혹은 기술 지배 체제에 관하여 (0) | 2018.07.14 |
|---|---|
| 플라톤의 『국가·정체(政體)』와 Man of Steel(맨 오브 스틸) (0) | 2018.07.14 |
| cuncta fluunt (0) | 2018.07.02 |
| 그때는 안 보이던 것들 (0) | 2018.06.24 |
| 유명론 혹은 제목은 독자를 헷갈리게 (0) | 2017.02.26 |